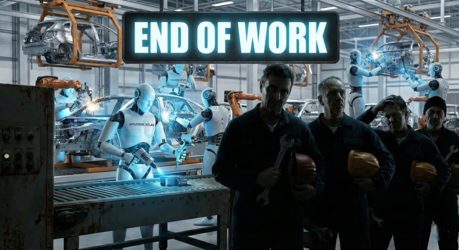[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국가우주항공청(KASA) 예산이 2025년 9649억원으로 확정되며(+27% yoy), 발사체·위성·탐사·항공·산업생태계 다섯 축에 자금이 배분됐다. KASA는 이 예산을 발사체·위성·탐사·항공·산업생태계 다섯 축에 배분해 ‘민간 주도 우주경제’의 기동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숫자만 보면 확장 기조가 분명하다.
2026년 정부 예산은 1조1131억원으로 1조원 시대를 맞는다. 과제는 이 돈이 '일정(속도)'·'원가(효율)'·'품질(성능)'이라는 세 좌표에서 실적으로 이어지느냐다. 이에 한국 우주산업이 커진 외형에 어울리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을지 살펴봤다.
■ 기업·인력은 늘었지만 ‘시장 파이’ 확대는 '답답'
29일 정부 공식 실태조사에 나타난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먼저 2022년 기준 국내 우주활동 참여 기관은 총 528곳(기업 442·연구기관 34·대학 52)으로 전년(510곳) 대비 소폭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위성활용 서비스·장비 264, 위성체 제작 122, 발사체 제작 117, 지상장비 115 순이다. 산업의 저변과 공급망(업체 수·참여 분야)은 넓어지는 추세다.
반면 매출 총량은 2020~2022년 ‘2조원대 정체’였다. 기업 수는 늘지만, 실제 거래·매출이 뒤따르지 않는 ‘분모 확대–성과 정체’였다. 특히 데이터·통신 등 위성 활용(다운스트림) 부문이 장기 계약·조달로 연결되지 못하면 고용과 투자 선순환이 약해진다.
■ 역량 축적⸱⸱⸱발사체의 민간 이양과 위성 포트폴리오
올해 11월로 예정된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를 준비 중이고 설계–제작–운용 전주기 기술이 민간(한화에어로스페이스)으로 이전되며 ‘민간 주도 반복발사·상용서비스’의 발판이 마련됐다. 이는 일정·원가·품질을 민간의 속도로 끌어올릴 전환점이 됐다.
위성 분야에선 정지궤도 통신·기상, 저궤도 통신, 소형 군집 등 포트폴리오가 다변화하면서 관측·통신 데이터의 상용·공공 수요를 동시에 겨냥했다.
항법 인프라에서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올해를 기점으로 국제 전문가 협의를 거듭하며 지상·우주 세그먼트 개발을 병행 중이다. KPS는 2030년대 중반 완전 운용을 목표로 ‘위치·시간’ 주권과 국산 칩·수신기 생태계를 열어줄 핵심 프로젝트다.
이를 진두지휘할 KASA는 작년 5월 사천에서 공식 출범했다. 정책·개발·산업화 기능을 한데 묶은 컨트롤타워다. 이에 예산 구조는 ▲우주수송 3106억원 ▲첨단위성 2123억원 ▲탐사 543억원 ▲항공핵심 405억원 ▲산업인프라 1153억원 등으로 ‘게이트형 투자’가 가능한 틀을 갖췄다. 관건은 이 돈이 사업화·조달로 얼마나 빨리 전환되느냐다.
■ 앞으로의 과제: ‘집행의 품질’과 ‘민간 수요’가 성패 가른다
한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는 향후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① 일정·원가·품질을 한 화면에(게이트형 핵심성과지표)
발사체·위성 개발은 한 공정 지연이 전체 일정을 흔드는 연쇄 의존 구조다. 따라서 분기마다 설계동결(CDR) 통과율, 초도품 시험성공률, 시험→양산 전환 기간, 기체/위성 1기당 단가 하락률을 공개하고, 지연 사유–교정 조치–재발 방지를 결산 문서에 남겨야 한다. 예산 총량보다 같은 잣대가 시장 신뢰를 만든다.
② ‘데이터 구매’로 민간 매출을 만든다(다운스트림 중심)
정지궤도 통신·저궤도 통신·SAR·PNT 등은 서비스형 위성(위성데이터·용량 구매) 모델을 도입해 공공이 초기 수요자가 돼야 한다. 정부의 품질관리·검보정 인프라와 결합하면 중소기업도 데이터 가공·응용서비스로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 예산이 R&D에만 머물지 않고 조달·매출로 환류하는 구조다.
③ 민간 이양 속도 유지(누리호→상업 발사)
누리호의 민간 전주기 기술 이전은 ‘상업 발사’의 출발선이다. 발사 주기(WDR~발사 간격)·가동률·출동시간, 페이로드 당 단가를 공개하면 해외 소형위성 사업자의 가격·신뢰 벤치마크에 오를 수 있다. 정부·KASA는 보험·발사장 슬롯·안전규정의 병목을 함께 풀어야 한다.
④ 공급망·소재 리스크 관리(티타늄·전자부품·소프트웨어)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은 티타늄 공급망 등 전략소재 리스크에 취약하다. 한국은 소재·부품 국산화와 더불어 소프트웨어·부품 인증(표준) 체계를 마련해 해외 조달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년 조달·표준화를 결합한 공급망 KPI가 필요하다.
⑤ 인재·창업 생태계(대회→실증→조달) ‘원스톱 트랙’
경연·챌린지로 발굴한 팀을 컴퓨팅·데이터·실증과제로 즉시 연결하고, 공공 조달 파일럿까지 이어지는 1년 내 원스톱 트랙을 운영해야 한다. 대회가 채용·매출로 이어질 때 청년 인재가 산업에 남는다. OECD도 인력공백과 산업기반 보강을 우주경제의 지속가능성 과제로 지목했다.
⑥ 항법(KPS)·안보(감시)·상업(통신·관측)의 삼각 편성
KPS는 칩·수신기–지도–타이밍 서비스로 산업 파급이 크다. 여기에 SAR·EO 데이터, 저궤도 통신 등 상업 위성을 묶으면 민간 수요가 살아난다. 방산·보안 프로젝트(예: 고해상도 SAR)와 민간 활용을 병행하는 듀얼-유즈 설계가 필요하다.
우주항공청 측은 "한국 우주산업은 기업·인력의 저변과 정부 투자의 스케일에서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산업의 체감’은 집행의 품질과 민간 수요가 결정한다.
이 전문가는 "분기마다 일정·원가·품질을 공개하고 데이터 구매–조달로 다운스트림 시장을 키우며 민간 이양의 속도를 유지할 때 비로소 예산→경쟁력의 변환이 일어난다"며 "2025년 결산이 그 분수령"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출처
• 우주항공청 누리집 '2025년도 예산안', '2026년도 정부 예산안
•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기정통부·IITP: '우주산업실태조사'
• 행정안전부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누리호 4차 발사 현황, ‘누리호 전주기 기술 이전’, 425 SAR 위성 2호 발사정책
• KASA 항법 인프라: KPS 개발 관련 정부 발표
• OECD 'The Space Economy in Figures'
[저작권자ⓒ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