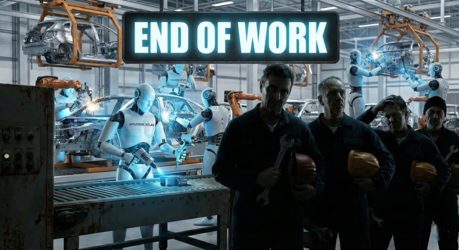[예결신문=김지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해 결산에서 매출 1조2903억원·영업이익 1327억원·당기순이익 152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엔 예산운영 총계 7조9009억원을 제시하며 재무활동 2조4115억원, 임대사업 1조8573억원, 택지·분양주택 2조680억원 집행을 예고했다. 숫자는 크고 방향은 분명하지만, 공고→계약→착수로 이어지는 절차에서 미숙함이 드러나고 있다.
24일 SH 공시자료를 살펴본 결과 먼저 지난해 손익 요약을 뜯어보면 분양택지 매출 1조665억원·매출원가 3486억원이 전체 이익을 떠받쳤다. 반면 임대사업은 매출 2148억원·매출원가 6838억원으로 영업 총이익이 마이너스다. 즉, 분양·택지 이익으로 임대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다. 그럼에도 전체로는 영업이익 1327억원, 순익 1526억원을 냈다.
재무상태는 자산 30조3015억원, 부채 20조236억원, 자본 10조2779억원(부채비율 약 195%)으로 집계됐다. 이자·상환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뜻이다.
올해 예산 지도도 선명하다. 수입 쪽은 판매사업수익 1조1681억원, 임대사업수익 1909억원, 대행사업수익 5680억원, 여기에 부채수입 4조6240억원과 자본금 출연 1683억원 등이 더해져 총 7조9009억원이다.
지출 쪽은 토지개발·분양 2조680억원, 임대사업 1조8573억원, 주택·토지 공급 4243억원, 대행사업 6900억원 그리고 재무활동 2조4115억원이 핵심이다. 숫자만 놓고 보면, 임대의 공공성과 재무비용의 중량감이 함께 드러난다.
문제는 절차의 시간표다. SH는 사업·재무 자료를 비교적 충실히 공개하지만, 입찰공고→계약, 계약→착수, 착수→준공 등에서 지연 사유 분류(▲보상 ▲인허가 ▲설계변경 ▲유찰 ▲공정충돌 등)가 공개되지 않는다. 이 공백은 곧 비용이다.
이는 곧 현장으로 가는 길의 병목이다. 구체적으로 ▲보상 협의가 늘어지면 설계와 공정이 줄줄이 미뤄지고(토지보상은 현지주민·부재지주 기준과 채권보상 등 세부 규정 존재) ▲인허가가 지연되면 발주 계획이 흔들리며 ▲유찰·재입찰이 반복되면 입찰→계약 구간의 체류시간이 길어진다. 이는 외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려운 배경이기도 하다.
임대 운영 손실을 분양·택지 이익이 메우는 구조에서 계약 직전 정체가 길어질수록 이자 비용과 기회비용이 함께 불어난다. 예산 항목 중 재무 활동 2조4115억원이 크다는 사실은 ‘사업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역설이기도 하다.
수혜의 방향은 맞다. SH는 올해에도 무주택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를 겨냥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등 취약계층 특화 상품을 연속 공급 중이다. 그러나 대상자 대비 실제 입주율, 입주 완료까지의 소요일, 권역·소득분위별 도달 범위는 알 수 없어 ‘누구에게 언제 집이 갔는가’를 검증할 수 없다. 현재의 모집·공고 중심 공시의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제기되는 비판은 세 갈래다. 먼저 ‘이익의 질’이다. 임대에서의 구조적 적자를 분양·택지이익으로 상쇄하는 구도는 분양시장 변동에 취약하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부재’다. 절차 경과일·지연 사유가 빠지면 재무활동(이자·상환) 지출 압력만 커진다. 마지막으로 ‘부채 민감도 공개 한계’다. 금리 25·50bp 변동, 착공·분양 지연에 따른 현금흐름 민감도가 정례 공시되지 않는다.
반면 ▲임대·대행·공공택지 등 공공성 유지 ▲취약계층 맞춤형 상품을 꾸준히 내는 정책 지향성 등은 지속 강화해야 할 부분이다.
한 주택재정·조달 전문가는 “SH의 재무는 시간과 도달률에 좌우된다. 전체 사업 진행 상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지연 사유 코드를 사업별로 표준화하면 이자 체류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며 “임대 적자는 공공성 비용이지만, 절차 지연은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공정 민감도 표준공시: 25/50bp, 착공 지연 시 재무활동·현금흐름 영향 시나리오 분기 공시 ▲재무활동 축소 로드맵: 차환·금리헤지·선급금 관리로 재무활동 2.4조의 비중 단계 축소 ▲지연 상위사업 컨설팅: 하위 20% 사업 즉시 원인 진단·재배치 등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