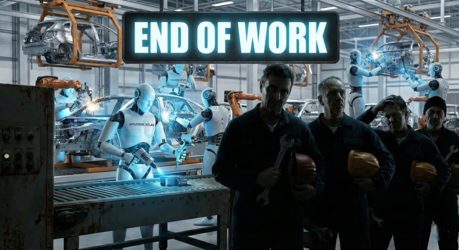[예결신문=신세린 기자]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며 최근의 부동산 상승세에 제동을 걸었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전세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면서 시장의 자금 흐름이 눈에 띄게 둔화됐다. 문제는 이런 '금융 안정책'이 건설사 현금흐름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 규제 강화, 현금순환엔 ‘경고등’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정비사업 위주(전체 매출의 60%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 건설사일수록 단기 유입 현금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잖아도 최근 건설 시장은 부동산 규제와 공사 원가 상승 분위기와 맞물리며 지난 1년간 인허가 승인 건수는 32% 감소했고 착공률도 55% 수준에 머물렀던 터다. 착공 지연은 곧 분양수입 회수 지연으로 이어지고 이는 PF(Project Financing) 이자 부담 증가로 직결된다. 문제는 정비사업 지연이 장기화되면 현금흐름 악화로 중견사까지 신용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 지방 미분양 98%, 불균형한 안정 구조
정부는 수도권의 과열을 진정시키겠다고 하지만 지방 분양시장은 이미 침체 상태다. 올 8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6만6000호 중 무려 98%가 비규제 지역인 지방과 수도권 외곽에 몰려 있다.
서울 규제가 시장 전체를 식히는 대신 지방은 회복이 더뎌지는 ‘비대칭 안정’ 현상이 나타난다. 건설사들은 수도권에서 밀린 사업을 지방으로 옮기려 하지만 미분양 리스크가 높아 착공조차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결국 10⸱15 대책은 '과열 억제'에는 성공하더라도 '균형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PF 만기, 다시 돌아오는 시계
상반기 PF 만기연장으로 숨을 돌렸던 금융권은 연말부터 재도래하는 만기 물량 앞에 긴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4.39%로 지난해 말보다 약 1%p 상승했다.
특히 올해 연장된 채권의 상당수가 6개월 단기물로,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자금 흐름이 막히면 현장부터 멈춘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9월 동우건설, 10월 유탑그룹 3사(유탑디앤씨·유탑건설·유탑엔지니어링)가 연이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만기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연쇄 회생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이다.
■ 정부 "질서 있는 연착륙"⸱⸱⸱시장은 "속도보다 자금 먼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앞서 7월 업무회의에서 "부동산 PF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건설산업 회생기금(1조2000억원)'을 편성해 부실 PF를 공공이 인수·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책 목표는 시장 급랭을 피하면서 금융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은 다르다. 건설사들은 "정책의 속도보다 자금 위기 속도가 빠르다"고 호소한다.
한 중견 건설사 재무담당 임원은 "금리가 높아도 착공을 멈출 수 없다. 그러나 대출 문턱이 높아져 현장 자금이 묶였다"고 말했다.
PF 연장 규모는 연말까지 약 28조원, 내년 상반기엔 40조원이 추가로 도래한다. 업계는 "연착륙보다 연쇄 회생이 더 현실적"이라고 진단한다. '시장의 시간표는 정책보다 빠르다'는 시장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야 할 시점이다.
■ 간단 요약
•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규제·대출 총량 축소, 건설사 유동성 경색
• 전국 미분양 98%, PF 만기 연말 재도래로 현금흐름 악화
• 정부 "질서 있는 연착륙"…업계 "속도보다 자금 먼저"
■ 출처
• 국토교통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한국신용평가 보고서, 금융위원회 브리핑, 한국은행 기자간담회
[저작권자ⓒ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